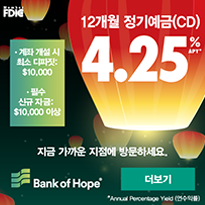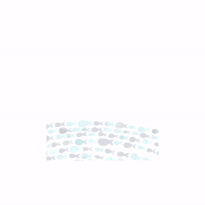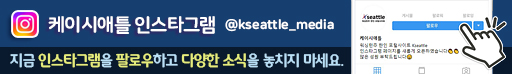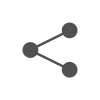시애틀 일본계 미국인들 이민정책 반대 시위…“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추모의 날(Day of Remembrance)’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 이민자들이 직면한 차별과 강제 추방이 과거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었던 역사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정의 및 이민자 권익 단체인 ‘두루미 연대(Tsuru for Solidarity)’가 주도한 이번 집회는 2월 19일 시애틀 차이나타운 국제지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미국 내 반 이민 정서 확산과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은 강제 수용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켰다.
소셜 연금 Q&A 언제 받으면 유리할까? 배우자 혜택은?
미국 세금신고 2탄! 주택 소유자를 위한 8가지 세금 공제
미국 세금신고, IRS 감사를 촉발하는 6가지 대표 실수
‘추모의 날’은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9066호를 기리는 날이다. 이 명령으로 인해 미 서부 해안에 거주하던 11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이주 및 수용소 생활을 겪었으며, 그중 약 70%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당초 집회는 시애틀의 유명 관광지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 개최 2주 전 해당 시장의 비영리 재단이 ‘저항(resistance)’이라는 메시지가 시장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이후 공식 사과했다.
두루미 연대의 공동 창립자이자 사무총장인 마이크 이시이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겪었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으며, 1798년 제정된 ‘외국 적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독일·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강제 수용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애틀의 힝 헤이 공원(Hing Hay Park)에서 집결한 뒤 일본 마을 골목(Nihonmachi Alley)에 위치한 치요 가든(Chiyo’s Garden)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가족이 강제 이주당했던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종이 신분증을 착용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인 톰 타지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 태그를 달고 행진에 나섰다. 그의 이름은 증조부의 형인 토마스 미노루 타지리와 같다. “그는 16살 때 강제 수용소에 갔다. 나는 지금 14살”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강조했다.
시애틀 기반 예술가인 에린 시가키는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기리며 증조부모 네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태그를 착용했다.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어두운 장면들은 종종 외면당한다”며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복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두루미 연대는 2020년부터 매년 ‘추모와 저항의 날’ 행사를 주최하며, 대규모 추방 중단과 이민자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왔다. 특히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북서부 ICE 처리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의 폐쇄를 요구하며, 이곳에서 수감된 이민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장기간 독방 수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치요 가든에서 연설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난민 정책 중단, 최근 몇 주간 수천 명의 이민자 체포, 미-멕시코 국경지대 군대 배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보호 종료, 관타나모 수용소 내 이민자 구금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ICE와 협력하는 주 교정국의 관행을 중단하고,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위한 신속한 사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루미 연대는 이민자 권익 단체 ‘라 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와 협력해 오는 일요일 타코마의 ‘북서부 ICE 처리센터’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킹 카운티 소유의 보잉 필드에서 이뤄지는 추방 항공편 운항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Nick Wagner / The Seattle Times)